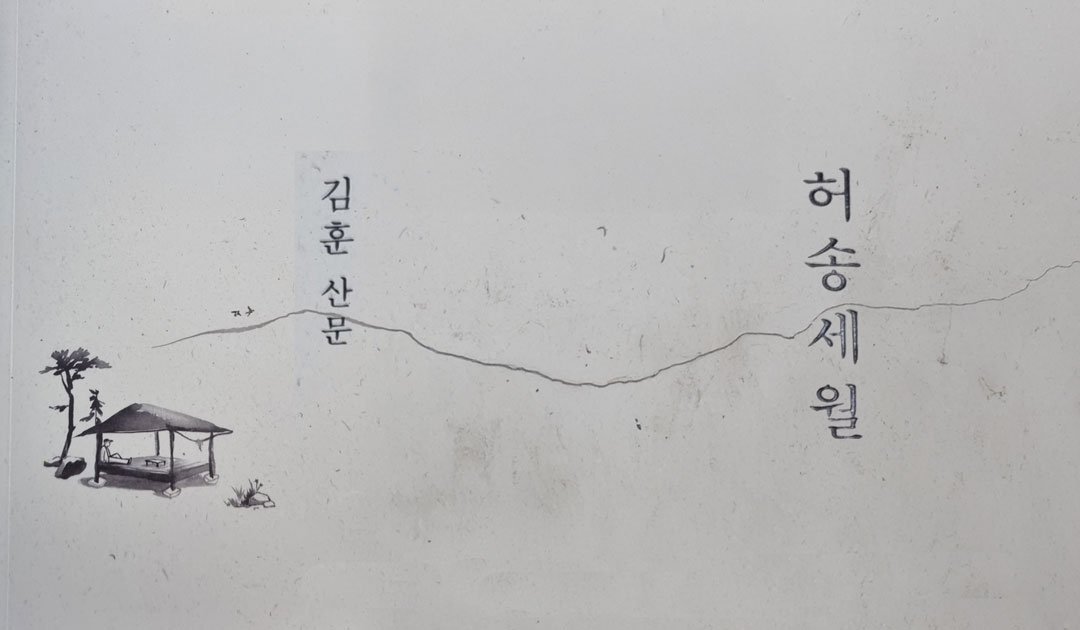어느 날 민속박물관에 놀러 갔다가 전쟁 때 쓰던 군용 철모에 긴 손잡이를 연결한 똥바가지를 보았다. 휴전 직후였던 내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흔히 보던 물건이, 박물관 진열장 속에서 조명을 받고 있었다. 군용 철모에는 턱 끈을 매다는 철제 고리가 양쪽에 붙어 있는데, 똥바가지는 이 고리에 손잡이를 고정시켜서 재래식 똥둣간의 똥을 퍼내는 생활용구였다. <중략> 똥바가지는 전쟁의 야만성을 생활 속으로 용해시키면서 웃음 띤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느 산악고지 참호 속에서 전사한 병사의 넋이 생활용구로 변해서 돌아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생활은 크구나, 라고 글자 여섯 개를 썼다. – [책 내용 중에서]
[북스저널] 허송세월 » 김훈 지음/ 출판사: 나남 » 소설가가 쓴 산문집으로 ‘생활은 크구나’는 이 책을 관통하는 여섯 글자고, ‘허송세월’은 책 안에 있는 여러 꼭지의 글 중 하나에 작가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허송세월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작가가, 시간의 질감을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육신의 관능으로 느끼며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散文(산문)’은 일반적으로 소설과 수필을 지칭하는데, ‘글자의 수나 율격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제한 없이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 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글을 문학적 장르로 구분해 보면 수필에 해당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작가처럼 허송세월한 것 같은데, 이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가꾼 후, 우리의 욕망까지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은 군인이 썼던 철모가 생활용구로 변해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이끄는 생활용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 생활용구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생활용구’로 바라본 죽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한다. 의술의 목표는 생명이고, 죽음이 아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처럼,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한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 살았으므로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고무호스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서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하다.”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책에 있는 여러 꼭지의 글을 가로지르는 ‘생활은 크구나’와 ‘허송세월’이란 시각으로 보면, 작가가 말한 대로 의술에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책은 산문으로 치장한 아포리즘(aphorism)의 색깔이 짙습니다. 그리고 이 아포리즘은 세상의 길과 이어진, 경건하게 먹는 행위와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는 혼밥을 하는 사람들의 밥 속에 있는 영성을 말하면서, 식당에서 혼밥을 하는 사람들에게 ‘혼밥은 혼밥 먹는 사람들의 더불어밥’이란 따스한 말을 전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언제부터인지 ‘금’과 ‘흙’이 사회경제적 특권의 서열을 표방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료의 명칭에 수저가 결합한 ‘금수저’와 ‘흙수저’는 불평등이 양극화되고, 특권이 세습되는 신분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자가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풍자에는 신분 사회에서 노동을 팔아서 밥을 벌고, 수저질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풍자는 빨리 사라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밥’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인류 공통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수저가 금과 흙으로 구별됨으로써, 흙수저를 쓰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밥의 성분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밥’이란 인류 공통의 운명에 신분 사회의 차별을 상징하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결합하면서부터, ‘대중식사’라고 간판을 붙인 식당에서 혼밥과 혼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파하면서 그들의 수저를 들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불어밥’이란 위로를 전합니다.
작가도 식당에서 혼밥을 먹으면서, 또 그의 옆에서 혼밥에 혼술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 맞는 좋은 말을 끄집어 와야겠다는 생각에 ‘더불어밥’이란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혼밥, 혼술’이란 말은 쉽게 하면서도, ‘더불어밥, 더불어술’이란 표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혼밥, 혼술’이 ‘혼자’로 끝나지 않고, ‘더불어밥, 더불어술’이 되는 세상도 있다는 것이 새로운 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혼밥, 혼술’은 이미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더불어밥, 더불어술’로 이해하는 세상을 꾸려가야 합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고, 3부에는 작가가 만났거나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영등포교도소 앞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사위를 맞이하기 위해, 두 살 난 손자를 등에 업고 기다렸던 모 작가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인이 됐고, 책에도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송세월이 허송한 세월이 아니라 질감으로 가득한 세월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작가 둘이 남긴 일화는 우리에게 ‘허명(虛名)의 유혹’을 자세히 들려줍니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모 작가는, 추운 날씨에도 그의 아들을 업은 채 아이의 아빠에게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고자 했던 장모에게, 제대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를 축하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분에 휩싸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작가가 남긴 말과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부터 그 작가는 장모의 눈 밖에 난 존재가 됐습니다. 그 작가는 암흑과 야만의 세월에 사회적 지표가 됐던 사람이지만, 그 일 후로 장모 앞에서만은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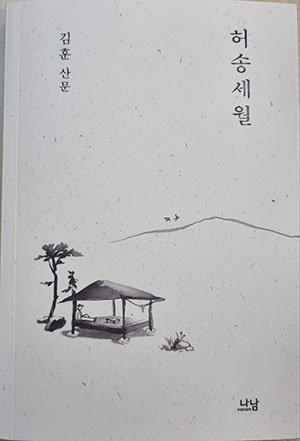
허송세월 표지 ◙ Photo&Img©ucdigiN
저는 책에 나오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허명의 유혹’을 읽습니다. 한때 암흑과 야만의 세월을 건너갈 수 있는 등대가 됐던 그였지만, 그도 허명의 유혹에 빠져 겨울, 차가운 교도소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기다렸던 두 살 난 아들과 장모’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는 장모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고, 책에도 그 장모의 사진만 나옵니다.
“인간은 사상이나 이념의 노예가 아니고, 노동과 교역은 인간이 지상에서 평화와 자유를 건설하는 토대며, 생활은 영원하다.” 작가는 아날로그로 점철된 시장에서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기호로 바꿔 문명의 개벽을 이룬 디지털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삶과 언어의 바탕은 기호화될 수 없기에,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대변되는 아날로그적 삶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가에 따르면 아날로그적 삶은 허송세월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몸과 마음을 빛과 볕으로 채우는 촉매제입니다.
필자 정이신(以信) 목사/ 본지 북스저널 전문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글 보기: 존엄성 수업
◙ Now&Here©ucdigiN(유크digitalNEWS)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