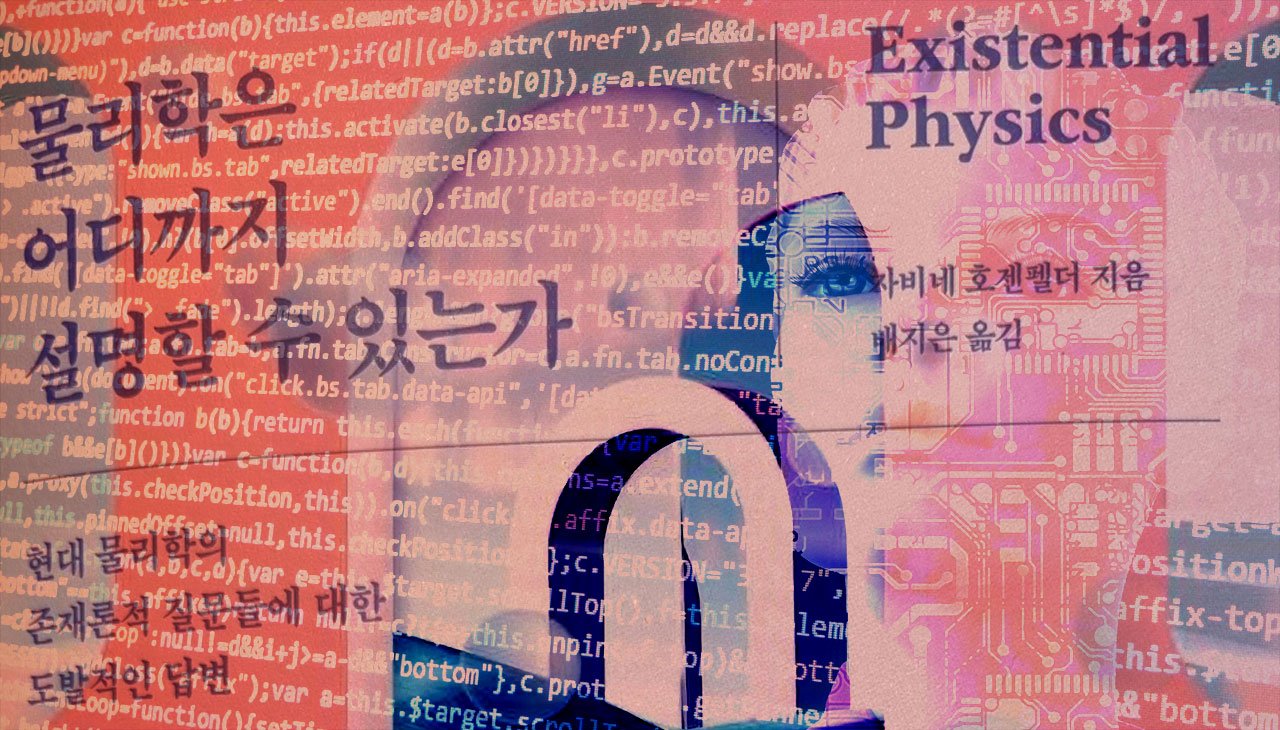[북스저널] 물리학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자비네 호젠펠더 지음, 배지은 옮김/ 출판사: 해나무 »
물리학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공유할 가치가 있어서일 뿐 아니라, 이 지식을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험에 관해 물리학이 알려주는 것들을 물리학자들이 앞장서서 설명하지 않으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들이 끼어들어 우리가 만들어낸 암호 같은 용어를 유사과학 증진에 써먹을 것이다. 양자 얽힘과 진공 에너지가 대체 요법 치료사, 영매, 약장수들이 자주 들먹이는 이론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리학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든 난해한 말들을 그런 사람들의 헛소리와 정확히 구분하기가 꽤 어려울 것이다. – [책 내용 중에서]
사람들은 물리학자에게 온갖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답‘만’ 듣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것은 물리학자가 실체를 직ㆍ간접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도, 그것에 관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물리학마저도 그들의 생각을 인정했다는 식의 언술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쩌면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은 인간이 아는 것까지만 설명하는데, 이를 위해 수학을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수학으로 서술될 뿐 아니라, ‘세상 자체가 수학’이란 주장은 가정이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까지나 답이 없는 ‘왜’라는 질문을 품은 채로, 해 아래 세상에 그대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야기할 때 예로 쓰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관찰자면서 관찰대상자로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한계를 지구에 사는 물리학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 있어야 관찰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구에서만 존재하기에, 늘 관찰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절대적인 관찰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저자가 책에서 말한 것처럼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비(非)과학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비과학은 유사과학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구분을 잘 모르면, 비과학을 과학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속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神)을 우주의 생명체라고 종교적 신념으로 해석하거나, 지구 평면설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속한 집단에서 정의한 잣대로만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저자는 과학과 비과학은 대화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순전히 믿음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의 존재 여부를 과학이 입증할 수 없기에, 과학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의 존재에 관한 논쟁은 모두 무(無)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과학은 신에 관한 그들의 주장은 과학이지만, 무과학은 비과학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이 뭔지 헷갈리게 혼동을 일으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과학과 무과학은 서로 공존하도록 두되, 비과학은 멀리 두고, 과학이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이 진행하고 있는 지식 발견의 과정에서 무과학의 대표자 격인 종교와 과학은 앞으로도 한참을 더 공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자면서 관찰대상자라는 한계가 과학의 주체라고 불리는 인간에게 여전하기에, 인간은 과학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방식의 설명을 앞으로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한계가 과학의 발전으로 모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말처럼 과학과 무과학은 공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 대한 어떤 사실들은 과학의 설명 없이 인간이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책에서 말한 여러 이야기 중에 과학으로 잘못 알려진 비과학의 모순을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비과학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비과학을 무과학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평면이라는 주장을 무과학으로 인정하면, 지구가 구(球)라는 과학적 사실은 오류가 됩니다. 더불어 무과학을 비과학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아야 하지만, 인간이 지닌 과학적 인식의 한계를 망각한 채, 무과학적 사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유럽의 중세처럼 어둠이 가득한 독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 아래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해를 주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 실체는 다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나온 자외선이 인간에게는 때로 해를 끼치지만,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게는 유익을 줍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다른 광선이 아닌 자외선을 왜 방출하는지 인간은 모릅니다. 그리고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법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무과학과 공존하는 법을 익혀두라고 합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저자는 인간의 역할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만물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주적 결정론은 붕괴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삶에 나타난 다양한 선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유의지의 유무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전개 가능한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자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지구가 환원적 요소로 구성돼 있고, 지구에 있는 거대한 합성체들의 행동도 그들을 구성하는 갖가지 요소의 특성에서 유도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에 실질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우리가 선택하는 좌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숲에 있는 나무는 인간이 일상에서 쓰는 달력의 숫자와 다른 시간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법칙이 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해 아래 세상에서 서로 다른 계층을 연결해 주는 지배 원리를 과학과 공존해야 하는 무과학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연산이 될까요? 우주도 인간처럼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저자의 ‘분명한’ 답은 ‘모른다’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과학으로 실행해 본 적이 없기에, 인간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정체성이 오로지 뇌로 인해서만 정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각자의 몸이 가진 온갖 기능별 특성을 통해 정해지는 것인지도 아직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물리학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계속 묻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을 통해 과학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대화를 나누고, 그 외의 영역은 무과학의 영역으로 취급해 공존시키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과학까지 과학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 정이신(以信) 목사/ 본지 북스저널 전문칼럼니스트
◙ Now&Here©ucdigiN(유크digitalNEWS)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